X세대 가고 '밀레니엄 세대' 뜬다
2002-03-25 23:51:56 read : 23503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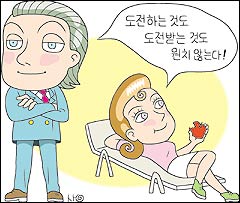
2002-03-25 23:45:45 read : 1
80년대 출생한 20대안팎...앞세대보다 덜 반항적-실용적
집단가치-명예 중시..."도전정신-민주의식 부족" 지적도
1980년대초나 그 이후 출생한 20대 안팎의 젊은이들은 그 앞의 ‘X세대’와 구별해서 ‘새천년 세대(Millennials)’로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X 세대 다음에 나온 ‘새천년 세대’들의 행태들은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닐 하우(Howe)와 윌리엄 스트라우스(Strauss)가 공저한 ‘새천년 세대의 부상(Millennials Rising)’을 보면 “이들 새천년 세대는 앞 세대들보다 덜 반항적이며, 더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감정보다는 명예를,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특징지었다.
◆ 새천년 세대들의 특징
뉴욕타임스(NYT)는 새천년 세대를 소개하는 기사 제목을 ‘논쟁(Debate)? 반대(Dissent)? 토론(Discussion)? 오, 거기에 가지 마라(Oh, Don’t go there)!’라고 붙였다. 과거 미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기도 했던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천년 세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들이다.
예일대 학부생 학장인 조셉 고든(Gordon)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대신 다른 견해에 자신이 속박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도전받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성문제 등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관용적이다. NYT는 ‘무엇이든(whatever)’이라는 낯익은 감탄사가 요즘 대학생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끌벅적한 기숙사나 식당 토론 문화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다른 견해를 그냥 그러냐 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대학 잡지인 앰허스트(2001년 가을호)에 한 대학생이 쓴 ‘조용한 강의실’이라는 글에도 “대학 상급생들은 자신의 지적 신념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요즘 신입생들은 부모나 교수의 권위를 더 존중하고, 논쟁을 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되어 있다.
◆ 무엇인 원인인가
NYT는 “논쟁을 삼가는 자세는 부분적으로 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1990년대 워싱턴을 흔들어 놓았던 공화·민주 양당간의 당파적 싸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200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대립, ‘크로스파이어’같은 TV 프로에서 진보와 보수간 상대방을 헐뜯는 광경 등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린스턴대 영어과 제프 누노카와(Nunokawa) 교수는 “논쟁이 우리 문화에서 나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새천년 세대들에게 논쟁은 토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라 반(反)지성적 방법으로 상대방을 못살게 구는 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새천년세대들의 논쟁 기피는 다원화 사회에서 서로 화합하며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논쟁을 통해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특히, 세상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논리와 열정을 상대로 자신의 신념을 펼치지 못하고, 의견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부인하고,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대 영어과 아만다 앤더슨(Anderson) 교수는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새천년 세대들이 학창시절 자신의 삶을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뉴욕=金載澔특파원 jaeho@chosun.com )
===================================
[유럽] “결혼은 NO, 아이는 OK” 미혼 부모 증가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붕괴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자녀까지 낳아 키우는 ‘미혼(未婚) 부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실제로 1999년 아이슬란드에서는 태어난 아기 10명 중 6명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노르웨이에서는 출생한 아기의 절반이 그런 경우였다는 것.
미혼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프랑스의 경우 41%, 영국은 38%에 달했고 이혼이 겨우 7년 전에 허용될 정도로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 아이슬란드에서도 30%가 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유럽에서 남부 이탈리아까지 전 유럽에서, 노동자에서 왕족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사랑하며 살면 됐지 ‘법률적 결혼’이 중요하냐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유럽보다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가 중시되는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1998년 9%에 그쳤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임신한 채 결혼식장에 서는 신부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동거녀와의 사이에 세자녀를 두고 있고 작년 미혼모와 결혼한 노르웨이의 하콘(Haakon) 왕세자는 결혼 전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노르웨이의 여성의원 마리트 안스타드(Arnstad)는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미혼모의 몸으로 임신, 현재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클라우드 마틴(Martin)은 “프랑스에서는 결혼과 동거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거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朴玟宣기자sunrise@chosun.com )
|